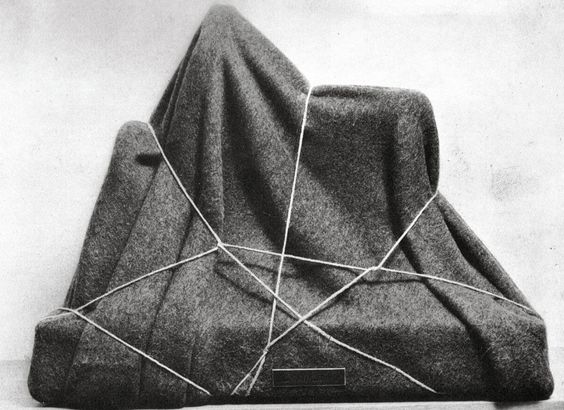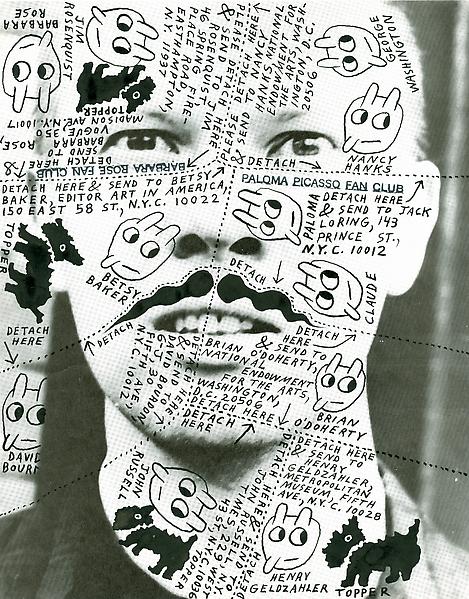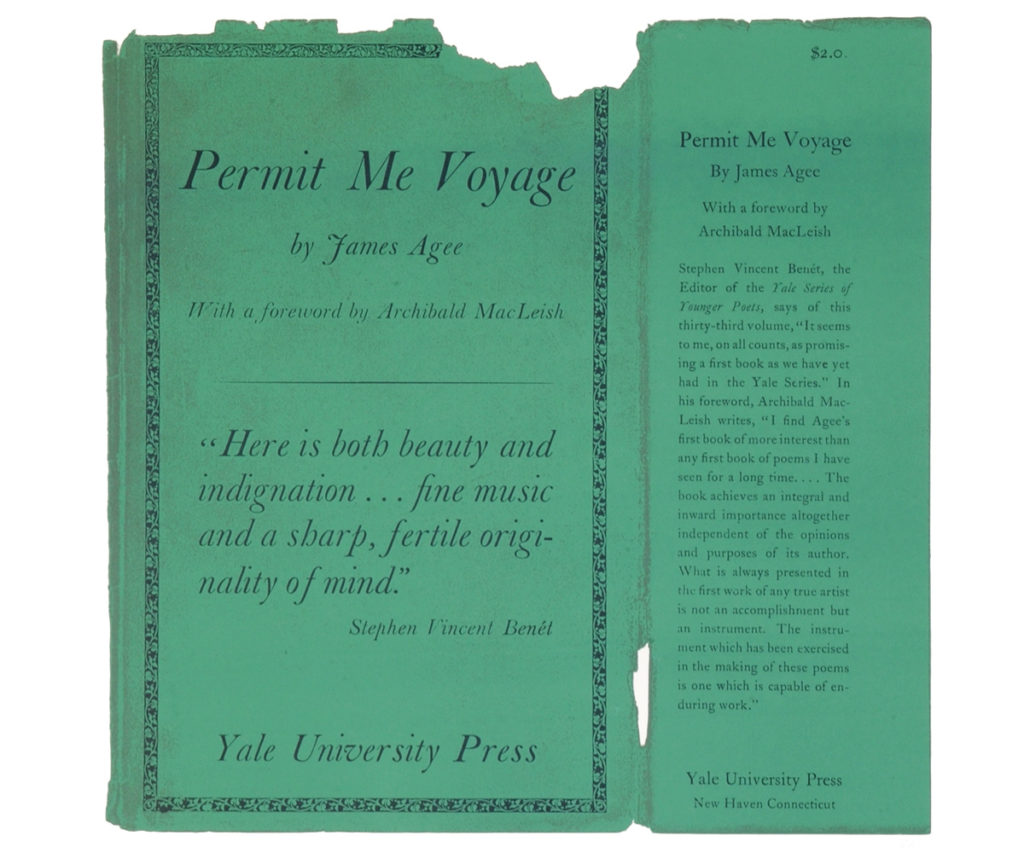윤형근의 전시장에서
Between Umber and Ultramarine : At the Exhibition of Yun Hyong Keun
Text and translation by 박상미 Mimi Park
데이빗 즈워너 갤러리에서 윤형근의 전시를 오픈하던 날 토크가 있었다. 한 평론가가 관객을 이끌고 갤러리를 돌며 윤형근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토크 중 윤형근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그림에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또 언제 그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거기서,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나는 그저 그린다. 마음 속에 정해놓은 목표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을 그리고자 한다. 그것이 나를 끝없이 나아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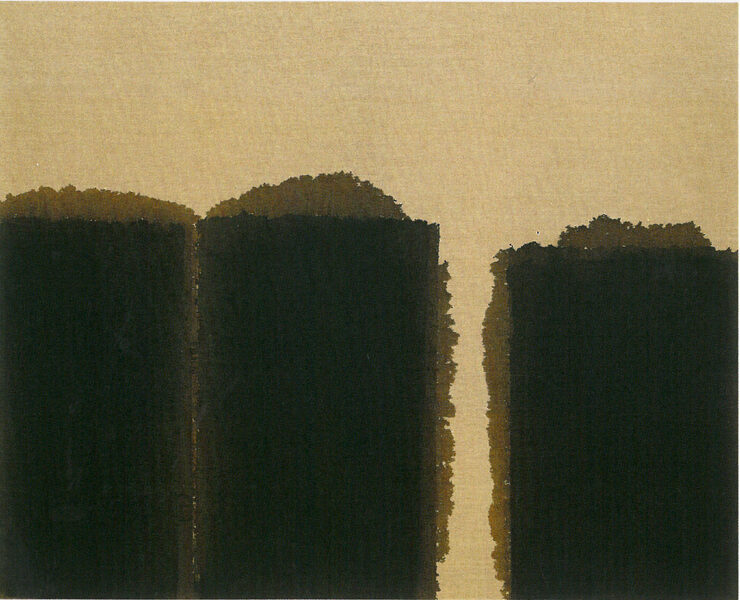
그 평론가는 그 말이 새무얼 베케트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한국어로 들었다면 그동안 흔히 들어온, 어느 단색화 화가라도 할 만한 얘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한 문구를 들으니 베케트의 부조리한 문장들이 생각나는 것이 사실이었다.
우선 윤형근의 말은 베케트와 조르쥬 뒤투이트가 주고 받은 서신의 일부를 발췌한 짧은 대화록 <세 가지 대화>의 내용을 연상시킨다. 이는 세 사람의 화가, 피에르 탈-코트, 앙드레 마송, 브람 반 벨데를 놓고 베케트와 뒤투이트가 주고 받은 대화를 기록한 것인데, 베케트는 이들을 논하는 듯하면서 창작에 관한 자기 자신의 고민을 드러낸다. 탈-코트에 대해 논하는 부분에서 그는 “표현할 것이 없는 상태, 표현할 재료도, 표현할 소재도, 표현할 힘도, 표현할 욕망도, 표현할 의무도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일”에 대해 말한다. 과거의 예술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거나, 진실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겠다는 야심찬 태도가 아닌, 표현할 것이 없는 상태가 출발점이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베케트의 소설 삼부작(<몰로이>, <말론 죽다>를 포함한)의 마지막 편인 <이름 붙일 수 없는 자> 는 “나는 계속할 수 없어. 나는 계속할 거야. I can’t go on, I’ll go on” 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데, 윤형근의 말은 이 유명한 문장을 또한 연상시킨다. 이 문장은 베케트 식 글쓰기의 전형을 예로 들때 자주 인용된다. 갈 수 없다고 해놓고는 바로 또 갈 거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처한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이 두 가지 예는, 즉 예술가의 ‘표현할 것 없음’을 선언했다는 점,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역설을 공공연하게 표현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베케트가 남긴 문학적 족적을 잘 요약해준다.
베케트가 그의 작품 세계를 이루게 된 경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베케트가 파리의 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할 때 제임스 조이스를 만났고 조이스와의 만남은 베케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베케트는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의 집필을 위한 리서치를 돕기도 하며 오랜 세월 그와 가깝게 지내게 된다. 그러던 중 베케트가 잠시 더블린에 다니러 갔을 때 그는 그의 엄마의 방에서 갑작스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후 집필한 그의 소설 몰로이Molloy의 도입 부분은 엄마의 방이 배경이 된다.) 그는 계속 이런 식이라면 평생 조이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제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깨달은 것이다. 즉, 조이스가 ‘더 많이 아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언제나 뭔가를 ‘더하는’ 식의 작업을 하고 있다면 자신은 그 반대, 즉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모른다’라는 사실을 큰 전제로, 더하기가 아닌 빼기 식의 가난한 작업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느낀 것이다. 그동안 서구의 의식 속에서는 용납되지 않던 ‘모른다’는 전제를 의식적인 하나의 방법론이자 태도로 삼은 것이다. 그는 또한 영어가 모국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로 글을 썼는데, 불어로 써야 스타일이 없는 문체로 쓰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릴지 모르고, 목표가 없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그린다는 윤형근의 말도 하나의 방법론이었을까. 어디선가 접점이 있는 듯 보이는 베케트와 윤형근의 정신 세계는 비교가 가능한 것일까.
노자는 <도덕경>의 첫째 장에서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이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고 했다. 노자는 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무와 유의 대비를 통해, 그 대비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가 있으면 무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케트가 자신의 방법론을 깨닫고 정립한 것도 ‘더 알고자’하는 세상을 향한, 그 반대편의 존재를 알리는 선언이었다. 노자의 ‘무’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무’의 상태가 아니라 유에 상대하는 ‘비어있는’ 상태에 가까운 것처럼, 베케트의 ‘모른다’는 언명 또한 그가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태도를 통해 경험하는 세계의 ‘오묘함’을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반대편의 세상과 만남을 꾀한 것이었다. 윤형근의 전시 토크에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다. 아무 것도 의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가 가능하냐고. 윤형근이 ‘의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의도 자체가 전혀 없는 ‘절대무’의 상태라기 보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림에 접근하겠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이는 윤형근 뿐 아니라 다른 단색화 작가들의 접근 방식이기도 했다.
언젠가 나는 단색화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쓴 적이 있다. 반복적 액션과 물성의 희박화가 그것이다. 그 중 반복적 액션에 대해 말하려면 한국의 선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의 정신 세계는 주로 유불선 (물론 샤머니즘도 빼놓을 수 없다)의 영향이 고루 섞여진 형태로 나타나는데(시대마다 주된 사상은 달라지지만) 이 세 종교에서 모두 자기 수양(수신, 몰아, 무위)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방법론, 그리고 궁극의 목표가 된다. 한국의 선비들은 매일 글을 읽고 쓰는 일을 되풀이했는데, 그 목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보다는 유불선에서 최고로 치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선비들은 일찌기 지식을 쌓으면 이를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소유와 동시에 무소유를 생각했고 자신을 잊는 행위를 통해 명징한 정신 세계에 도달하려 했다.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비들은 매일 반복해서 글을 읽고 또 썼다. 선비들의 글쓰기인 서예는 먹을 갈아 한지 위에 붓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를 말하는데, 선비들은 자신의 글 뿐 아니라 이미 있는 싯구나 문장을 썼다. 선비의 서예는 (서양의 글쓰기와 비교되는) 두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는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신체의 자세와 움직임에 그 중요한 근거를 두고 있어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글을 쓰느냐가 서체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동양의 서예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쓰기와 그리기를 합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서양의 쓰기는 물론 그리기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 서양의 전통적인 쓰기와 그리기에서는 애초부터 신체성이 대체로 배제된 반면 서예에서는 어떤 몸과 마음 가짐으로 서예에 임하느냐가 기본이었다. 몸을 바로 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리는 선의 결과가 서예인 것이다. 두 번째는 선비의 글씨란 선비의 인격이, 그 수양의 정도가 시각적 스타일로 승화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인격을 뜻할 수 있는 말로 personality나 character같은 단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이 갖는 특질에 더 가깝지 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덕이나 품격의 정도를 나타내주지는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이 서양에서 윤형근의 회화나 단색화를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측면이다. 베케트와 윤형근의 접점이 있다해도 아마도 이 부분에서 그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윤형근은 반복해서 자신의 그림이 추사 김정희 글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윤형근의 이 말은 자신의 그림이 한국의 서예와 수묵화 전통에서 온 것이며, 그림을 그릴 때의 몸과 마음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높은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다. 고결한 인격의 성취는 몰아, 무위를 통한 마음의 평정 상태를 갖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명상을 할 때 생각을 없애고 자아를 잊어야 비로소 현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고결한 인격도 욕망과 의도와 집착과 취향을 모두 잊고 방 한가운데 정지한 촛불처럼 세상의 숨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윤형근의 회화는 반복되는 액션을 통한 반복적 패턴을 낳는 방식보다는(박서보, 정상화 등의 회화에서 보이는) 반복적인 액션과 형태가 모두 감추어지는 방식을 택한다. 물감을 계속해서 덧칠하는 그의 액션은 물감이 더 깊고 어두운 색감으로 캔버스에 스미는 효과를 낳는다. 상반되는 두 개의 색–엄버와 울트라마린–으로 깊고 어두운 색을 만든 그의 화법 속에도 상반되는 관계 속에서 화면 위의 이치를 파악하려 한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그림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림은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 ‘모른다’라는 겸허한 선언을 통해 서양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추사의 스타일까지 뛰어넘는 ‘오묘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After reading this aloud, the critic remarked how much it sounded like Beckett. And indeed, it did. Had I heard it in Korean, it might have sounded like the kind of statement any Dansaekhwa artist would make. But translated into English, its existential openness echoed Beckett’s absurd, austere clarity.
In Three Dialogues, a short exchange between Samuel Beckett and Georges Duthuit, Beckett confesses:
“The expression that there is nothing to express, nothing with which to express, nothing from which to express, no power to express, no desire to express, together with the obligation to express.”
In the same vein, in the final novel of his trilogy, The Unnamable, Beckett famously writes, “I can’t go on, I’ll go on.”
Both statements capture his legacy—a writer who insisted on expressing the impossibility of expression itself. In their blunt paradox, they resemble a Zen koan—absurd, yet luminous.
An anecdote explains how Beckett arrived at this style. While teaching in Paris, Beckett befriended James Joyce and assisted in the research for Finnegans Wake. Returning briefly to Dublin, he had a revelation in his mother’s room—described in the opening of Molloy. Realizing he would always remain in Joyce’s shadow if he followed the same path, Beckett turned toward subtraction:
“Joyce had gone as far as one could in the direction of knowing more… I realized that my own way was in impoverishment, in lack of knowledge and in taking away, in subtracting rather than in adding.”
For Beckett, “not knowing” became a method, radical, especially in the West, where knowledge is often privileged over intuition or mystery. In this sense, Yun’s declaration that he “doesn’t know what to paint” might also be understood as a methodology. Could Beckett and Yun be spiritual kin, each articulating a creative practice rooted in the concept of emptiness?
The first chapter of the Tao Te Ching begins:
“The Tao that can be told is not the eternal Tao. / The name that can be named is not the eternal Name… / Nothingness is the origin of Heaven and Earth, / Being is the mother of the ten thousand things.”
Lao-tzu does not define Tao in a straightforward way. Instead, he speaks of it as the relational tension between nothingness and being. Through that contrast—something and its absence—we come to understand the world.
Beckett’s embrace of unknowing thus stands in contrast to a culture of certainty. And Lao-tzu’s “nothingness” is not the absolute void of Western metaphysics, but a generative emptiness. Beckett’s attitude of “not knowing” becomes a way to meet the world with mystery intact. Similarly, when someone at the Zwirner talk asked Yun how painting is possible without intention, the response was that “not intending” doesn’t mean aimlessness—it means letting go of the extrinsic desires that clutter the act of 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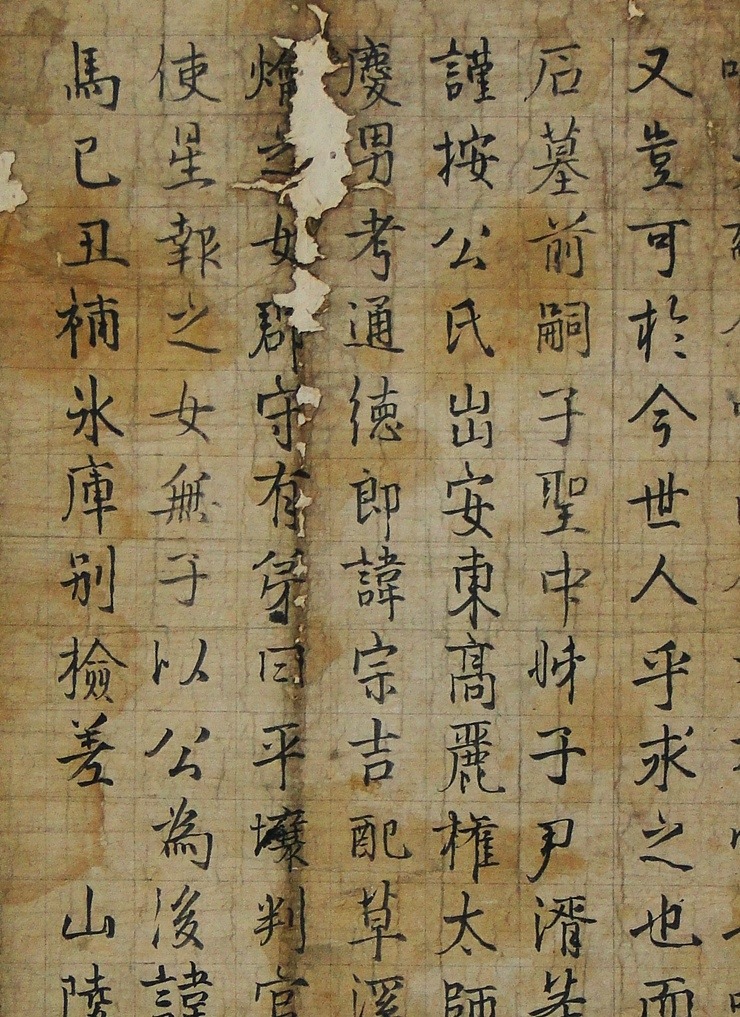
I’ve previously described Dansaekhwa as having two core tendencies: repetitive action and the rarefaction of materiality. These are deeply embedded in the traditions of seonbi, the Korean scholar-gentleman. Korean spirituality—a blend of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shamanism—values self-cultivation through the pursuit of disciplined emptiness. The seonbi read and wrote daily, not only to pass the civil service exam, but to cultivate moral and aesthetic refinement.
Calligraphy, a daily practice, exemplifies this. Ink is ground slowly, posture is deliberate, and the writing becomes a fusion of body and mind. Unlike Western writing, which often distances itself from physicality, Eastern calligraphy emphasizes it: the brush is moved by breath, the hand by rhythm, the style by virtue. In Korea, one’s calligraphy was not separate from one’s character—it revealed it.
Yun Hyong Keun often cited Kim Jeong-hui (pen name: Chusa) as an influence. His painting continues this tradition: a fusion of body and spirit, stillness and force. In Korean aesthetics, integrity is not merely moral—it is metaphysical. It demands obliteration of the self, the erasure of desire, like a still candle light in a windless room.
Unlike his Dansaekhwa peers such as Park Seo-bo or Chung Sang-hwa, whose repetitions reveal structure and surface, Yun Hyong Keun’s repetitions seem to erase themselves. His act of painting—layering the same vertical forms over and over—gradually darkens the canvas, like a memory or emotion deepening with time. Working with two opposing colors, umber and ultramarine—being and nothingness—he may have sought redemption through the act of obliteration: a quiet washing away of the painful memories that haunted his existence.
Yun says that he does not know what a painting should be or what a painting is. Yun’s humble declaration of “not knowing” may be a way closer to the mysterious state of painting itself.

RELATED POSTS